하루 한 뼘 성장드라마
예쁘기만 한 공주는 가라! 본문
소미를 가지고 꽤 배불러서 이오덕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. <우리글 바로
쓰기> <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> <무엇을 어떻게 쓸까> 그런 책을 쓰셨다.
글쓰기 교육과 현재 엄청나게 오염된 우리말과 글을 되살리는 일에 70을 훨씬 넘긴
노구를 아끼지 않는 분이다.
그 분의 강의 중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좀체 잊히지 않을 내용이 있다. "너무 책을
많이 읽지 말아라"라는 말이다. 책 속에 파묻혀 살고 책을 쓰면서 늙었을 사람에게서
그런 말을 듣는 일은 적잖은 양의 찬물을 뒤집어쓴 기분이었다. 할수록 좋은 일이
책 읽는 일인 줄 알았는데.
결론은 너무 많은 책읽기는 몸을 움직여 땀흘려 일할 기회를 놓치거나 때로는 뭘
해보려해도 방해받기 쉽다는 것이다. 한마디로 노동의 가치가 한 수 위란 말이다.
하긴 책만 읽은 사람은 이론은 많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경우가 많다. 다
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.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제 손과 몸으로 직접 해보는
것이 좋다는 말이지 정말 책을 읽지 말란 말은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했다.
우리는 '간접 경험'을 책의 큰 미덕으로 꼽는다. 하지만 실제 자기가 해본 일과 간접경험
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제법 넓은 틈이 늘 생기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.
어떤 음식을 저명한 요리연구가가 쓴 요리책을 보고 만든다. 그런데 옆집 어른이
만드셨을 때보다 뭔가 턱없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간 것처럼 맛이 없다. 이건 바로
내 얘기다. 이처럼 자꾸 만들어보아야 손맛이 는다는 말도 이것과 통하는 말일 것이다.
며칠 전 소미가 저녁을 다 먹고 자꾸만 부엌 개수대에 붙어 서서 물장난을 하고
있었다. 제 아빠는 근무고 저녁잠을 잔 소은이가 뒤늦게 밥을 먹은 탓에 거기에는
남은 설거지가 있었다. 밥그릇에 고인 물도 깨끗하지 않고 소매 젖을까봐 그만 하라고
했는데도 떨어질 줄 몰랐다.
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참에 소미에게 설거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.
다른 소리는 귓등으로 듣더니 그 소리에 고개를 홱 돌려 두 눈을 반짝였다.
"소은이 먹은 거 설거지 내가 해요? 엄마?"
소은이가 앉은뱅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앉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아주었더니
그 위에 서서 그릇을 씻었다. 그런데도 여전히 수도꼭지에는 손이 닿지 않아서 물
조절은 내가 해주었다. 하긴 그편이 물 낭비가 덜했다.
그 쬐끄만 고사리 손으로 동생이 먹은 밥그릇 하나, 접시 두 개, 수저, 컵 하나를
씻는데 참으로 보기 위태로웠다. 미끄러운 그릇을 살짝 떨구기를 몇 번, 오목한 밥
공기에 고인 물을 완전히 빼지도 않고 휙 건조대에 올리다 제 얼굴이며 내 옷에 물이
튀기도 했다. 행주로 개수대 주변을 깨끗이 닦고 행주를 다시 빨아두어야 설거지가
마무리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났다.
"엄마, 나 설거지 잘해요? 멋지죠? 소미 정말 큰언니 됐죠? 그치요?"
잘 했다, 수고했다, 엄마가 할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했는데도 계속 물었다.
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얼굴 가득했다. 어른들이나 하는 큰
일쯤으로 아는 설거지를 해냈으니 그런 기분이 들만도 했다.
다음날, 성당에서 공동구매한 맛있는 김 한 상자를 샀다. 소미 친구 초이네도 한
상자 사겠다고 해서 내가 가져다주려고 했다. 옆 통로라 나만 금방 뛰어갔다 오면
될 일인데 소미가 따라가겠다고 했다. 소은이랑 아주 조금만 둘이 있으면 된다고
하는데도 징징대며 울 기세였다. 에휴, 그러면 둘을 다 옷 입혀야 하는데 갔다오는
시간보다 채비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 뻔했다.
"소미야, 그럼 네가 초이네 갔다 주고 올래? 초이네 집 알잖아."
"엄마 심부름하는 거예요? 소미가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?"
신이 났다. 자긴 아주 잘할 수 있다나? 외투를 입고 장갑까지 낀 손에 한 봉지에
열 장씩 든 조미김 열 봉지가 담긴 한 상자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짧게 끈을 묶어
들려주었다. 땅에 끌리지는 않았고 가벼웠다.
잠시 후 소미는 의기양양, 희색만면, 승승장구(?)한 표정으로 돌아왔다.
"엄마, 초이 아줌마가 돈도 주셨어요. 엄마 드리래요."
주머니에서 만 원 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. '흐흐, 이젠 참으로 쓸 만하게 컸군'하는
생각에 이번엔 거울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내 얼굴이 자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다.
하긴 소미의 심부름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.
지난 여름엔 백여 미터 떨어진 그 먼 거리(?)에 있는 PX까지 갔다왔다. 비닐봉지에
'두부 한 모, 쭈쭈바 두 개'라고 쓴 메모지와 돈을 들려보냈다. 그런데 베란다 창 밖으로
내다보니 두부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비닐봉지를 펄럭이며 친구와 둘이 쭈쭈바를
빨며 오고 있었다. 얘네들이 메모지는 잃어버리고 두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들 먹을
것만 샀나 했었다. 알고 보니 두부가 없다고 하더란다. 더운데 그냥 다녀오려면 쭈쭈바에
대한 유혹이 클 것 같아서 사먹고 오라고 한 것이데 정작 사야 할 것은 꽝이 되어
버려 한참 혼자 킬킬댔던 기억이 난다.
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더 시집은 잘 간다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었다.
나도 한 둘 보았고. 평생 할 일인데 뭐 벌써부터 설거지 같은 걸 시키느냐 하는 분도
있다. 곱게 공주처럼 길러야 시집가서도 공주 대접, 왕비 대접받으며 산다는 말도
들었다. 그리고 한때 그 말에 크게 고개를 주억거린 적도 있다.
그래도 역시 제 손과 발, 온몸을 움직여 땀흘리고 체험한 것으로 귀한 정신의 재산을
불려나가는 것이 더 매력 있다. 이제 소미 세대는 여자가 여자로만 사는 일은 더욱
매력 없을 것이다. 사람으로서 사는 일, 남에게 빛이 되는 삶이려면 그냥 곱게 공주처럼
길러서는 안 되겠단 생각이 강해진다.
머리를 쓰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아이들은 창의력이 개발되고 어른들은 치매를 예방할
수 있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그것도 만들어진 놀잇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. 실제를
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. 환경이 참 그 결심을 어렵게 만들겠지만 쉽게
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. 주변에서 소미가 할 수 있는 일, 소미가 몸으로 해낼 수
있는 일을 오늘도 두리번거려 찾는다.
♣소미가 최근 다 지난 탁상용 달력에 그린 그림들.
순서대로 <곰> <학원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썼다는 그림(?)> <산> <숫자>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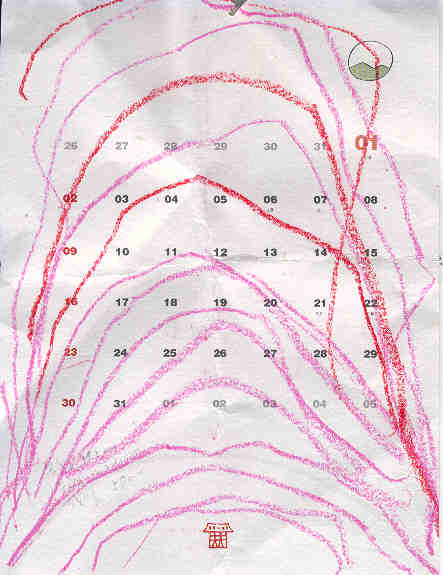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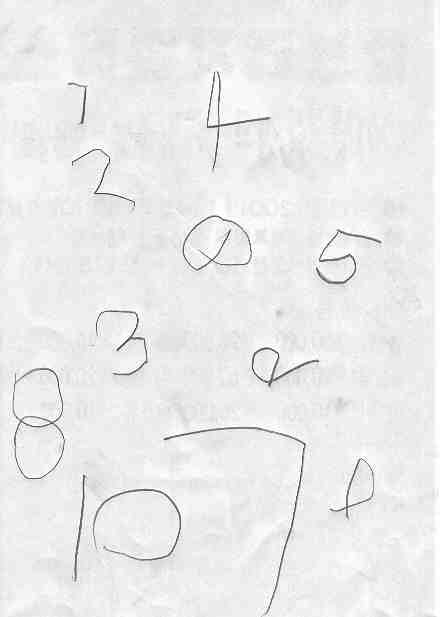
쓰기> <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> <무엇을 어떻게 쓸까> 그런 책을 쓰셨다.
글쓰기 교육과 현재 엄청나게 오염된 우리말과 글을 되살리는 일에 70을 훨씬 넘긴
노구를 아끼지 않는 분이다.
그 분의 강의 중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좀체 잊히지 않을 내용이 있다. "너무 책을
많이 읽지 말아라"라는 말이다. 책 속에 파묻혀 살고 책을 쓰면서 늙었을 사람에게서
그런 말을 듣는 일은 적잖은 양의 찬물을 뒤집어쓴 기분이었다. 할수록 좋은 일이
책 읽는 일인 줄 알았는데.
결론은 너무 많은 책읽기는 몸을 움직여 땀흘려 일할 기회를 놓치거나 때로는 뭘
해보려해도 방해받기 쉽다는 것이다. 한마디로 노동의 가치가 한 수 위란 말이다.
하긴 책만 읽은 사람은 이론은 많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경우가 많다. 다
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.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제 손과 몸으로 직접 해보는
것이 좋다는 말이지 정말 책을 읽지 말란 말은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했다.
우리는 '간접 경험'을 책의 큰 미덕으로 꼽는다. 하지만 실제 자기가 해본 일과 간접경험
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제법 넓은 틈이 늘 생기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.
어떤 음식을 저명한 요리연구가가 쓴 요리책을 보고 만든다. 그런데 옆집 어른이
만드셨을 때보다 뭔가 턱없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간 것처럼 맛이 없다. 이건 바로
내 얘기다. 이처럼 자꾸 만들어보아야 손맛이 는다는 말도 이것과 통하는 말일 것이다.
며칠 전 소미가 저녁을 다 먹고 자꾸만 부엌 개수대에 붙어 서서 물장난을 하고
있었다. 제 아빠는 근무고 저녁잠을 잔 소은이가 뒤늦게 밥을 먹은 탓에 거기에는
남은 설거지가 있었다. 밥그릇에 고인 물도 깨끗하지 않고 소매 젖을까봐 그만 하라고
했는데도 떨어질 줄 몰랐다.
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참에 소미에게 설거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.
다른 소리는 귓등으로 듣더니 그 소리에 고개를 홱 돌려 두 눈을 반짝였다.
"소은이 먹은 거 설거지 내가 해요? 엄마?"
소은이가 앉은뱅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앉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아주었더니
그 위에 서서 그릇을 씻었다. 그런데도 여전히 수도꼭지에는 손이 닿지 않아서 물
조절은 내가 해주었다. 하긴 그편이 물 낭비가 덜했다.
그 쬐끄만 고사리 손으로 동생이 먹은 밥그릇 하나, 접시 두 개, 수저, 컵 하나를
씻는데 참으로 보기 위태로웠다. 미끄러운 그릇을 살짝 떨구기를 몇 번, 오목한 밥
공기에 고인 물을 완전히 빼지도 않고 휙 건조대에 올리다 제 얼굴이며 내 옷에 물이
튀기도 했다. 행주로 개수대 주변을 깨끗이 닦고 행주를 다시 빨아두어야 설거지가
마무리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났다.
"엄마, 나 설거지 잘해요? 멋지죠? 소미 정말 큰언니 됐죠? 그치요?"
잘 했다, 수고했다, 엄마가 할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했는데도 계속 물었다.
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얼굴 가득했다. 어른들이나 하는 큰
일쯤으로 아는 설거지를 해냈으니 그런 기분이 들만도 했다.
다음날, 성당에서 공동구매한 맛있는 김 한 상자를 샀다. 소미 친구 초이네도 한
상자 사겠다고 해서 내가 가져다주려고 했다. 옆 통로라 나만 금방 뛰어갔다 오면
될 일인데 소미가 따라가겠다고 했다. 소은이랑 아주 조금만 둘이 있으면 된다고
하는데도 징징대며 울 기세였다. 에휴, 그러면 둘을 다 옷 입혀야 하는데 갔다오는
시간보다 채비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 뻔했다.
"소미야, 그럼 네가 초이네 갔다 주고 올래? 초이네 집 알잖아."
"엄마 심부름하는 거예요? 소미가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?"
신이 났다. 자긴 아주 잘할 수 있다나? 외투를 입고 장갑까지 낀 손에 한 봉지에
열 장씩 든 조미김 열 봉지가 담긴 한 상자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짧게 끈을 묶어
들려주었다. 땅에 끌리지는 않았고 가벼웠다.
잠시 후 소미는 의기양양, 희색만면, 승승장구(?)한 표정으로 돌아왔다.
"엄마, 초이 아줌마가 돈도 주셨어요. 엄마 드리래요."
주머니에서 만 원 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. '흐흐, 이젠 참으로 쓸 만하게 컸군'하는
생각에 이번엔 거울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내 얼굴이 자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다.
하긴 소미의 심부름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.
지난 여름엔 백여 미터 떨어진 그 먼 거리(?)에 있는 PX까지 갔다왔다. 비닐봉지에
'두부 한 모, 쭈쭈바 두 개'라고 쓴 메모지와 돈을 들려보냈다. 그런데 베란다 창 밖으로
내다보니 두부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비닐봉지를 펄럭이며 친구와 둘이 쭈쭈바를
빨며 오고 있었다. 얘네들이 메모지는 잃어버리고 두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들 먹을
것만 샀나 했었다. 알고 보니 두부가 없다고 하더란다. 더운데 그냥 다녀오려면 쭈쭈바에
대한 유혹이 클 것 같아서 사먹고 오라고 한 것이데 정작 사야 할 것은 꽝이 되어
버려 한참 혼자 킬킬댔던 기억이 난다.
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더 시집은 잘 간다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었다.
나도 한 둘 보았고. 평생 할 일인데 뭐 벌써부터 설거지 같은 걸 시키느냐 하는 분도
있다. 곱게 공주처럼 길러야 시집가서도 공주 대접, 왕비 대접받으며 산다는 말도
들었다. 그리고 한때 그 말에 크게 고개를 주억거린 적도 있다.
그래도 역시 제 손과 발, 온몸을 움직여 땀흘리고 체험한 것으로 귀한 정신의 재산을
불려나가는 것이 더 매력 있다. 이제 소미 세대는 여자가 여자로만 사는 일은 더욱
매력 없을 것이다. 사람으로서 사는 일, 남에게 빛이 되는 삶이려면 그냥 곱게 공주처럼
길러서는 안 되겠단 생각이 강해진다.
머리를 쓰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아이들은 창의력이 개발되고 어른들은 치매를 예방할
수 있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그것도 만들어진 놀잇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. 실제를
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. 환경이 참 그 결심을 어렵게 만들겠지만 쉽게
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. 주변에서 소미가 할 수 있는 일, 소미가 몸으로 해낼 수
있는 일을 오늘도 두리번거려 찾는다.
♣소미가 최근 다 지난 탁상용 달력에 그린 그림들.
순서대로 <곰> <학원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썼다는 그림(?)> <산> <숫자>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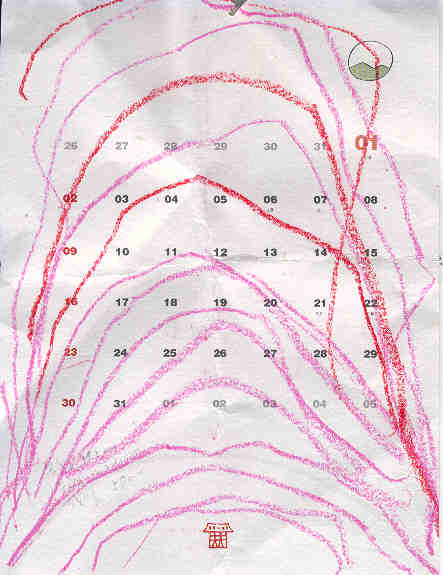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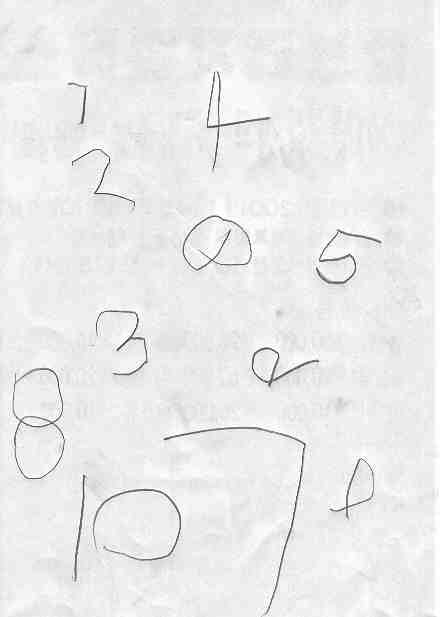
'사랑충전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I세대 떡잎에 물주기 (0) | 2001.02.08 |
|---|---|
| 노란 자전거 (0) | 2001.01.18 |
| 어른이 놓친 것을 보는 아이 눈 (0) | 2001.01.07 |
| 언니노릇은 힘들어! (0) | 2001.01.06 |
| 군인성당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(0) | 2000.12.28 |
